요즘 한창 번역서 막바지 작업 중인 아내가 책의 한 구절을 작업실에 있는 나에게 보내왔다.
냉장고... 그 냉장고는 생각을 한다.
아내가 번역가 이미령으로 처음 맡은 책이 SmartThings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관한 책이었다. 지금은 사물인터넷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원서가 처음 출간되던 2010년에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화두였다. 어문학과 사회과학 계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책이었을텐데도 감수자와 나한테 물어가며 꽤 열심히 번역을 마무리 했더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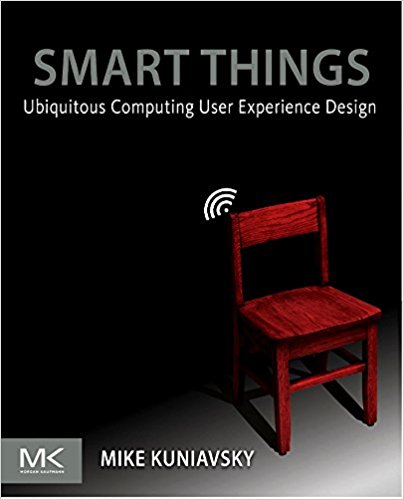
늘 있는 편집과 탈고를 몇 차례 한 후 드디어 출간 직전 책 제목을 정할 때가 되었다. 원서 제목인 SmartThings를 그냥 쓰기에는 너무 와닿지 않아서 역자도 출판사도 다른 이름을 고심하고 있었다. 나도 같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때 아내가 번역 도중 들려준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떠올랐다.
첫 번째는 월풀의 스마트 냉장고가 실패한 사례, 두 번째는 나바즈타그라는 요즘의 AI 스피커와 제법 닮아있는 귀여운 토끼모양의 기기였다. 참고로 나바즈타그도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의아할 독자를 위해 말하자면, 특이하게도 이 책에는 실패 사례가 많았다.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걸 감안하면 적절한 주제 선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글의 주제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으니 이쯤에서 다시 책 이름으로 돌아가보자.

아내가 들려준 여러 사례 중 그 두 가지가 가장 인상적이었으므로 책 이름으로 정해도 되겠다 싶어서 책 이름을 이렇게 제안했고 그대로 출판이 되었다.
생각하는 냉장고, 뉴스읽는 장난감
제목이 정해지고 나자 표지도 조금 더 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었고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책 제목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보통의 다른 번역서와 마찬가지로 원서의 표지를 그대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뿌듯함이 더해진다. 실제 내용은 사례를 중심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책인데도 원서의 어두운 표지는 마치 대학교때 보던 전공 서적을 떠올리게 해서 독자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지 않을까 싶었었다.
이 책 전에도 후에도 직접 책 제목을 지어보고 그게 책으로 나온 경우는 없어서 나에게는 나름의 애착이 있는 책이다. 아마 첫 번역이었던 아내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책 제목과 비슷한 표현을 또 다른 책에서 발견한 덕에 잠깐 추억에 젖을 수 있었다.
여담이지만 이 책은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5년 우수과학기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창부수... 대단합니다.